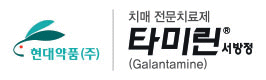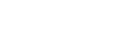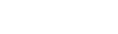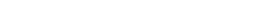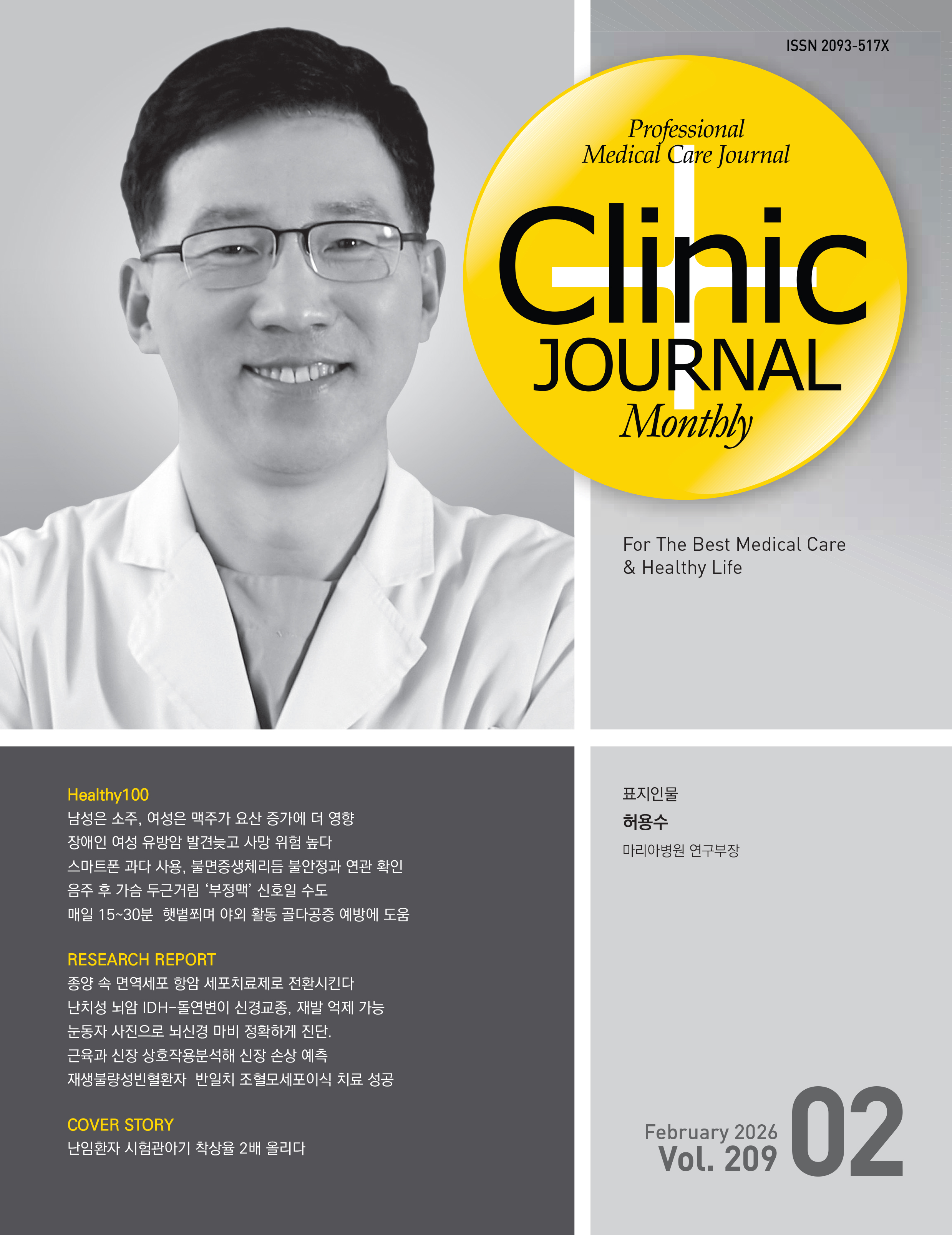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2월 24일(화)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하였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 「암정복10개년계획」 제1기(’96~’05)ㆍ제2기(’06~’15), 「암관리종합계획」 제3차(’16~’20)ㆍ제4차(’21~’25)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하였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었다. * 국가암검진 대상인 6대 암 : 위, 유방, 대장, 간, 폐, 자궁경부 ** (상대생존율) 암환자를 동일한 성별, 연령군의 일반인과 비교해 환자 집단이 생존한 비율 *** (국한, localized) 암이 발생한 장기를 벗어나지 않은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필수의료인 암에 대해서도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와 함께 지역 암관리 체계 마련 필요성도 부각되는 상황이다. 암 진단 이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국민 30명당 1명(3.3%)인 169만 7,799명으로(’23년 기준) 생존자 건강관리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및 호스피스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암데이터도 529만 명 구축(’25년 기준) 등 그간 양적 확대에 집중하였으나,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암데이터 생산 및 검증, 활용도 제고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인공지능(AI) 활용 등 첨단 암 연구를 위한 지원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부는 ‘모두를 위한 암관리, 더 나은 건강한 미래’를 비전으로, ▲암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 향상, ▲지역완결적 암 의료체계 구축, ▲암생존자 건강 증진 및 돌봄 강화, ▲AI 기반 구축을 통해 암 연구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번 종 합계획은 학계 및 전문가, 의료현장 등 의견 수렴을 거쳐, 4개 분야, 12개 중점과제, 68개 세부과제로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