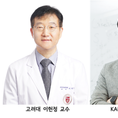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헌정 교수와 KAIST 수리과학과 김재경 교수팀이 기분장애 환자에서 우울증상의 발생이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수학적 모델로 밝혀냈다. 기분장애는 안정적인 기분 조절의 어려움으로 상당기간 정상범위보다 처지는 상태로 유지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들뜨는 경우로, 흔히 조울증이라 부르는 양극성 장애, 우울증이라 부르는 주요우울장애 등을 포함한다. 기분장애 환자들은 정상인에 비하여 반복적으로 기분의 악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기분증상의 악화에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의 교란이 연관있다는 사실은 경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면패턴과 일주기 생체리듬 중에 어느 쪽이 직접적으로 기분증상의 악화를 가져오는 지, 혹은 기분증상의 악화가 역으로 이들의 교란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인과 관계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다. 김재경 교수-이헌정 교수 공동연구팀 (KAIST 박사과정 송윤민, 고려의대 박사과정 정재권 등)은 기분장애 전향적 코호트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장기간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한 139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환자들은 수면과 일주기리듬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웨어러블기기를 착용하고 스마트폰으로 매일 기분 증상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 치료에서 3개월 이하의 단축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시행 후 티카그렐러 단독요법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홍명기·이용준 교수 연구팀은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3개월 이하의 단축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 후 티카그렐러를 단독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기존 12개월 장기 이중항혈소판제 요법과 비교해 허혈성 사건 발생률에 차이가 없고 출혈성 사건은 약 46% 줄일 수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럽심장학회지’(European Heart Journal, IF 39.3) 최신호에 게재됐다.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의 스텐트 삽입술 시행 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과 같은 허혈성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필수적이다. 미국·유럽 심장학회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안전형 협심증 환자보다 허혈성 사건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를 12개월동안 장기간 유지하는 이중항혈소판제요법을 권고하고 있다. 장기간의 강력한 이중항혈소판제 요법은 허혈성 사건 발생을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출혈성 사건 발생을 높일 수 있어 두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이기홍 교수팀은 유전자 치료를 이용해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했다. 이기홍 교수팀은 최근(5월2일) 세계적인 학술지인 ‘네이처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Nature biomedical engineering)’에 ‘완전방실차단 돼지 모델에서 유전자 치료로 인공심박동기 대신 스스로 박동할 수 있는 치료법’을 발표했다. ▲ 이 기홍 교수 완전방실차단은 심방과 심실 사이 구조물인 방실결절이 망가져 스스로 심장이 박동할 수 없는 질환으로, 치료법은 인공심박동기 이식이 유일했다. 인공심박동기는 전흉부를 절개한 후 큰가슴근 위에 인공구조물을 삽입하고 심장까지 유도선을 삽입하여 연결하는 시술이다. 인공심박동기 이식은 현재까지 완전방실차단의 가장 우선적인 치료법이지만, 치명적인 염증으로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약 10년마다 재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 소아 환자의 경우 신체 크기보다 오히려 인공박동기 크기가 커서 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초래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연구진은 미국 에모리 대학과 공동으로 유전자치료가 인공심박동기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을 연구해 왔다. 이에 따라 이 교수 연구팀은 스스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정형외과 김성재 교수(주관연구개발기관)와 세종대학교 바이오융합공학과 김민성 교수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뉴바이올로지학과 이창훈 교수(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팀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세포치료제 개발’ 주제가 ‘2024년도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됐다.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재생의료 분야 핵심?원천기술의 발굴부터 치료제 및 기술의 임상단계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김 성재 교수 ▲ 김 민성 교수 ▲ 이 창훈 교수 이번 연구과제는 ‘인간 유도만능 줄기세포 기반 유전자 편집 고기능성 슈반세포를 이용한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세포치료제 시작품 개발’이라는 과제명으로 올해 4월부터 4년 9개월간 총 약 23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이뤄진다.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은 유병률이 매우 높고 심각한 증상을 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질환이다. 이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감각의 소실로 인해 심한 화상이나 조직 괴사 등의 합병증을 겪거나, 24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현재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의 치료는 주로 항경련제, 항우울제, 혹은 비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순환기내과 유철웅, 정주희 교수팀이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약물 불응성 심인성 쇼크 환자에서의 사망률을 예측할 수 있는 ‘PRECISE 점수’를 개발했다. 국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발되어 한국인에게 최적화된 최초의 예측모델이다. 심인성 쇼크는 병원 내 사망률이 높으며, 그 중 급성 심근 경색으로 인한 심인성 쇼크는 가장 예후가 불량하다. 국제적으로도 주목하고 있는 분야로서 세계 연구자들이 앞다투어 연구하고 있지만 국내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관련 연구가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 유 철웅 교수 ▲ 정 주희 교수 이번에 발표된 PRECISE 점수는 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연령, 혈중젖산, 혈압, 신장기능, 좌심실박출률 등을 포함한 15가지 변수를 종합하여 도출된다. 유 교수팀은 손쉽게 PRECISE 점수를 도출할 수 있는 웹계산기를 추가 개발했다. 특히 이 계산기는 해외의 다른 예측모델들과는 달리, 확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여 직관적이고 세밀한 예측결과를 도출한다. 이 계산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웹에 공개되어있어 향후 높은 활용 가능성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구팀은 2014년부터 2018년 까지 국내 심인성쇼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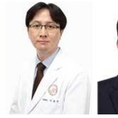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승순 교수 공동연구팀(한림대학교 생명과학과 김봉수 교수)은 위산억제제와 항생제 병용 처방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전파를 활성화해 다제내성균 감염 위험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양성자펌프억제제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내 항생제 내성 유전자 전파를 활성화시켜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킨다(Proton pump inhibitors increase the risk of 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colonization by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antibiotic resistant genes among bacteria in the gut microbiome)’는 제목의 연구로 밝혔다. ▲ 이 승순 교수 ▲ 김 봉수 교수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 감염증(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은 다제내성균 감염증 중 하나로 항생제인 카바페넴 계열에 내성을 가진 균(내성균)이다. 이 감염증은 효과적인 항생제가 많이 없어 치료가 어렵고 치명률이 높다. 하지만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중증 알코올성 간염에서 스테로이드 치료가 효능을 보이는 면역학적 기전을 세계 최초로 규명한 연구가 발표됐다. 이순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교신저자)와 성필수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교신저자), 강민우 가톨릭 간연구소 연구원(제1저자)은 최근 ‘중증 알코올성 간염에서 활성 조절 T 세포의 증가를 통한 스테로이드의 효과 분석(Expansion of effector regulatory T cells in steroid-responders of severe alcohol-associated hepatitis)’ 논문(인용지수 IF 5.0)을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를 타깃으로 한 새로운 치료 약제 개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이번 연구의 의미를 설명했다. ▲ 이 순규 교수 ▲ 성 필수 교수 연구팀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과 서울성모병원에서 알코올성 간염으로 새롭게 진단받은 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중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한 환자군(18명)과 경증으로 스테로이드 치료를 안 한 환자군(29명)의 치료 전후 혈액 내 조절 T 세포 포함 면역세포를 비교 분석했다. 아울러 스테로이드 치료군에서 치료에 대한 반응 유무에 따른 조절 T 세포 등 면역세포

양극성장애 환자에게 아리피프라졸 장기 지속형 주사제(메인테나)를 사용한 경우, 재발률이 1/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성장애(조울병)는 조증/경조증 삽화, 우울 삽화, 혼재성 양상 등 경과에 따라 다양한 임상 양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불충분한 치료시 2년 이내에 40~75%가 재발하는 등 높은 재발률을 보인다. 양극성장애가 자주 재발하는 경우 회복이 더욱 어렵고, 뇌에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장기간 약물 복용이 필수적이지만, 매일 약물을 복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적정 용량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약물 복용을 중단하여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발된 1회 주사로도 4주간 약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아리피프라졸(비정형 항정신병약물 계열)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조현병 뿐 아니라 양극성장애 유지치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원명 · 우영섭 교수 연구팀은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다기관, 1년 장기, 거울상 연구를 통하여 아리피프라졸 장기 지속형 주사제 사용이 양극성장애의 재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국내 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산부인과 조현웅 교수·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공동연구팀이 암 표적 형광물질과 복강경 형광영상시스템을 이용해 자궁암 수술 중 림프절 전이 여부 확인 및 림프절 정밀제거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자궁암은 최근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질환으로 주로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 림프절 전이를 확인하고 제거하는 광범위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해 왔는데 수술 시, 하지림프종 등 ▲(좌측부터) 고려대 구로병원 부인암센터 조현웅 교수,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구 교수, 전옥화 박사, 정소현 임상강사 수술로 인한 합병증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조현웅 교수 연구팀은 자궁암 림프절 전이를 가진 동물모델을 구축하고, 전이성 림프절을 감지할 수 있는 형광조영제인 ‘인도사이아닌그린’(ICG)과 ‘네오-만노실 인간 혈청 알부민 인도사이아닌그린’(MSA:ICG) 조영제의 표적화 능력을 비교했다. 정밀검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암 표적 형광물질(MSA:ICG)이 전이림프절 종양에서 CD206(형광신호)발현이 크게 증가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기존에 사용하던 형광조영제(ICG)의 경우 전이림프절과

초음파를 이용한 모니터링이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공급장치) 치료 중 발생할 수 있는 혈전을 확인하는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조덕곤‧현관용‧임공민 교수팀이 초음파의 속도가 혈액보다 혈전에서 더 빠르다는 개념을 활용해 에크모 서킷 혈전 모니터링을 시행한 결과, 에크모 서킷 내 혈전 유무에 따라 초음파의 파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조 덕곤 교수 ▲ 현 관용 교수 ▲ 임 공민 교수 에크모(ECMO)는 심‧폐질환에서 고식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환자의 심‧폐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다. 에크모 치료 중 혈전이 발생하는 빈도는 30~40% 정도인데, 환자의 예후에 치명적일 수 있는 합병증이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임공민 교수(주저자)는 “초음파 센서로 에크모 서킷을 모니터링 한 세계 최초의 연구”라며,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초음파 파형 변화를 활용한 모니터링 기법이 향후 에크모 서킷 내 혈전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이우진 교수, 고려대학교 전자·정보공학과 황한정 교수 연구팀(이화아니 충북대학교 연구원)은 양쪽 귀에 다른 주파수를 보내 특정 뇌파의 형성을 유도하는 ‘동적 바이노럴 비트’ 기술로 불면증을 개선하고 수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몸은 잠이 드는 순간부터 여러 단계의 비렘수면(NREM)과 렘수면(REM)을 순환하는 이른바 ‘수면 사이클’을 통해 신체 전반을 회복하고 건강한 생체리듬을 유지하는데, 수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질환을 수면장애라고 ▲(왼쪽부터) 윤창호 교수 이우진 교수 황한정교수 한다. 이화아니 연구원 수면장애를 겪는 환자들은 주간 졸림, 만성피로,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불면증이나 우울증, 나아가 심근경색·뇌졸중과 같은 심뇌혈관질환을 비롯해 치매 등 각종 중증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 최근 연구에서는 국내 성인의 60%가 만성적으로 수면 불편감을 겪고, 이 중 약 절반이 불면증에 해당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성인(약 3,600만 명) 중 삼분의 일가량이 불면증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반면, 불면증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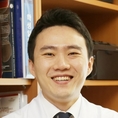
수술이 불가능한 간암을 치료하기 위한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높은 치료 효과를 보이며 1차 치료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면역항암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암이 악화된 환자들은 표준 치료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 간암 표적치료제를 사용했을 때 평균 생존 기간이 14개월이 넘었다는 전향적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종양내과 유창훈 교수팀은 면역항암제 치료에도 효과가 없었던 47명의 간세포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다중표적치료제인 카보잔티닙을 사용한 결과, 카보잔티닙을 2차 치료제로 사용한 경우 평균 생존 기간이 무려 14.3개월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혔다. ▲ 유 창훈 교수 현재 수술이 불가능한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 카보잔티닙을 포함한 다중표적치료제가 대체로 사용되고 있지만, 후향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 명확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치료 시작부터 연구팀이 직접 추적 관찰하는 신뢰도 높은 전향적 연구 방식으로 진행돼, 간세포암 2차 치료제로서 다중표적치료제 카보잔티닙의 효과가 밝혀졌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홍콩 중문대학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다국가, 다기관 연구 결과는 간질환 분야에서 전세계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