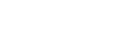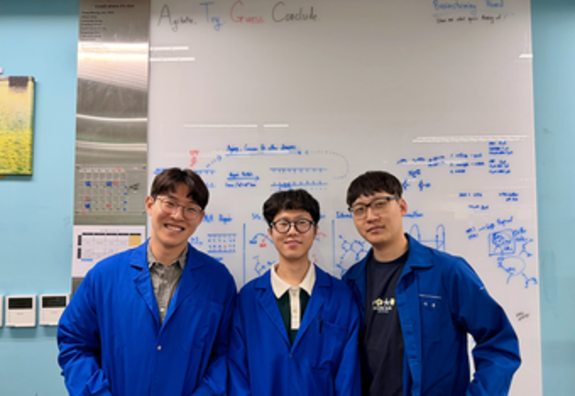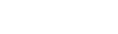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라면 적정 체중 이하로 살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체중이 줄어들면 병이 악화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이다.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박혜윤·신선혜 교수 연구팀은 강원대병원 호흡기내과 김우진 교수·의생명연구소 권성옥 박사 연구팀과 함께 건국대병원 유광하 교수가 이끄는 한국 COPD 코호트(KOCOSS)를 분석해 이 같이 밝혔다.
COPD는 흡연을 비롯한 유해한 입자나 가스 흡입으로 인해, 기관지와 폐실질의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이 일어나 정상 노화에 비해 폐 기능이 더 빨리 감소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성 2명 중 1명 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COPD 코호트에 등록된 환자 1,264명을 대상으로 만성기관지염 및 신체질량지수(BMI)가 COPD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환자들의 평균 나이는 69.1세로 대다수가 남성 환자(1150명, 91%)였으며, 대부분 COPD 코호트 등록 당시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26%), 과거에 담배를 피웠던 환자 (65%) 였다. 전체 COPD 환자의 약 3분의 1은 (451명, 36%) 만성 기관지염 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성 기관지염은 기침과 가래가 최근 2년간 적어도 석 달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연구팀은 COPD의 악화 위험인자인 만성기관지염 증상과 비만을 가르는 경계인 체질량지수 (BMI) 25 (kg/m2)를 기준으로, 만성 기관지염 동반 여부, 비만 여부에 따라 환자 유형을 4가지로 나눴다.
COPD는 환자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가 싶다가도, 호흡곤란 등 갑작스레 병이 악화되는 게 특징이다. 게다가 폐 질환의 특성상 한 번 병세가 깊어지면 증상이 누그러지더라도 다시 반복적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고, 증상 또한 이전보다 더욱 심해진다. COPD 진단 이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연구팀에 따르면 COPD 악화가 가장 빈번했던 환자는 BMI 25 미만이면서 만성 기관지염을 동반한 환자였다. 해당 환자 353명 중 184명에서 1년 이내 급성 악화가 관찰됐다. 1000인년으로 환산시 763명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기관지염은 없지만 BMI가 25미만인 환자가 1000인년 기준 572명으로 발병이 잦았고, 만성기관지염은 있지만 BMI 25 이상인 환자가 1000인년 기준 526명으로 뒤따랐다. 만성기관지염도 없고, BMI도 25 이상인 환자는 1000인년 기준 402명으로 나머지 유형과 비교해 가장 낮았다.
이를 토대로 COPD 악화의 상대적 발생 비율을 보면 만성기관지염이 없다면 BMI 기준으로 25 이상인 환자보다 25 미만인 환자의 발생비가 21% 더 높았다.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환자라면 BMI 25 미만일 때 발생비는 41%까지 껑충 뛰었다. COPD 환자 중 만성기관지염을 달고 사는 환자라면 체중이 낮은 환자가 병을 관리하는 데 불리하다는 의미다.
이러한 차이가 나온 데 대해 BMI가 낮을수록 BMI가 높은 환자들보다 근육량이나 영양 상태가 불량 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COPD를 악화시키는 폐기종의 정도가 더 심한 경향을 보이는 데다, 체중이 낮은 탓에 COPD 악화 예방을 위한 치료제 선택에 제한이 많은 것도 이유로 꼽혔다.
그렇다고 무작정 살을 찌우는 게 COPD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호흡 재활 프로그램 등을 통해 꾸준히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박혜윤 교수는 “여느 질환처럼 만성폐쇄성폐질환도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병의 악화를 막을 수 있다”면서 “특히 평소 기관지염이 잦은 환자라면 살이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인 ‘호흡기연구(RESPIRATORY RESEARCH)’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