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김원섭) 정형외과 조병기 교수가 최근 발목인대 수술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조병기 교수 연구팀은 '봉합테이프 보강술(Suture-Tape Augmentation)을 이용한 변형 브로스트롬 수술법(Modified Broström Procedure)'을 통해 만성적인 외측 발목 불안정성 치료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제시했다. 이 연구 논문은 국제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최근 게재됐다. ▲ 조 병기 교수 봉합테이프 보강술은 손상된 발목 인대 재건 부위에 추가적인 기계적 안정성을 부여함으로써 인대가 재생되고 주변 연부조직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인대 조직을 보호하는 인공인대(artificial ligament)의 개념으로 개발됐다. 다양한 생역학 연구들을 통해 기존의 봉합술이나 재건 수술법, 그리고 정상 발목 인대와 비교해 매우 우수한 기계적 안정성과 내구력이 입증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술 후 보다 적극적인 재활과 빠른 일상 복귀가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 수술법은 환자 개개인의 남아 있는 발목 인대 상태와 관계없이 발목 관절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루게릭병 환자의 호흡 기능 평가는 주로 폐활량 검사를 통해 이뤄지지만, 구강안면 근육이 약한 환자는 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에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딥러닝 기술로 흉부 CT 영상에서 폐와 호흡근 부피를 분석해 새로운 검사 지표를 개발했다. 이 영상 기반 지표는 루게릭병 병기 및 생존 기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검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최석진·성정준 교수(김종수 전문의) 및 영상의학과 박창민·최규성 교수 공동 연구팀은 루게릭병 환자 261명의 흉부 CT 영상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신경과 최석진 교수·김종수 전문의· 성정준 교수, 영상의학과 박창민·최규성 교수 루게릭병은 뇌와 척수의 운동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는 치명적인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병이 진행될수록 호흡근까지 마비되며, 발병 3~4년째면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른다. 이에 루게릭병 환자는 폐활량 검사(측정기를 입에 물고 숨을 깊게 들이쉰 후, 한 번에 힘껏 내쉴 수 있는 공기량을 측정하는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호흡 기능을 측정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치료 방침을 결정한다.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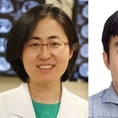
국내에서 처음으로 급성기외과(ACS, Acute Care Surgery) 시스템을 도입한 서울아산병원은 5명의 전문의로 구성된 외과응급수술팀이 365일 24시간 병원에 상주하며 장폐색, 장천공 등 빠른 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 환자들의 수술 결정, 집도, 수술 후 관리까지 직접 책임지고 있다.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이건희 전문의팀은 2017년 ACS 시스템 도입 전후 응급 일반외과 환자의 임상적 결과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응급실 도착부터 수술실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0분 단축됐고, 수술 후 합병증 발생률도 7%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홍 석경 교수 ▲이 건희 전문의 기존 당직제(TROS, Traditional On-call System)에서는 외과 의사들이 정규 수술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면서 당직 근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응급수술 요청 시 지체 없이 대응하기 어려웠고, 그로 인해 수술 결정 및 집도 시간 지연, 의사의 피로도 증가, 환자 예후 악화 등의 한계가 있었다. 반면, ACS 시스템에서는 응급실 의료진이 1차 진료 및 기본 검사를 시행한 뒤,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상주하고 있는 외과응급수술 전담

1형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가 간헐적 스캔형 혈당측정기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가 손끝 채혈 대신 팔이나 배 등에 패치 형태를 부착해 혈당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는 5분마다 자동으로 혈당 수치를 측정해 전송한다. 간헐적 스캔형 혈당측정기는 사용자가 직접 센서를 스캔해 혈당 수치를 확인하는 기기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재현∙김지윤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김서현 박사 연구팀은 실시간 연속혈당측정기와 간헐적 스캔형 기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대한당뇨병학회 공식 학술지 DMJ(Diabetes & Metabolism Journal, IF=6.8)’ 최근호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해 2019년에서 2022년 사이 연속혈당측정기를 한 번 이상 사용한 제1형 당뇨병 환자를 분석했다. 이 중 초속효성 인슐린을 3회 이상 처방 받으며 꾸준히 인슐린 치료를 받은 환자 7,786명을 최종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 중 소아·청소년 환자는 1,911명이다. 추적 관찰 기간은 연속혈당측정기 처방 시부터 24개월까지다. 측정에 사용한 실시간 연

국내 연구진이 기억력 회복과 치매 억제에 효과적인 새로운 물질을 찾아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박길홍 명예교수 공동연구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 아산의료원, 충남대 신약전문대학원)은 ‘프테로신 D(pterosin D)’라는 성분이 뇌 속 신호 전달 단백질을 자극해, 기억력 향상과 알츠하이머병 진행 억제에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프테로신 D는 기존 치매 치료제와 달리 뇌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새로운 작용 방식으로, 뇌세포 안에서 기억과 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PKA, 단백질 키나아제 A)을 자극한다. ▲박 길홍 명예교수 이 단백질이 활발해지면 신경세포 성장, 기억 형성에 중요한 단백질(BDNF, TrkB)들이 활성화되어,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좋아진다. 실제로 알츠하이머 유전자를 가진 실험쥐에 프테로신 D를 3개월간 먹인 뒤 미로 실험을 한 결과, 공간학습과 기억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또한, 프테로신 D는 기존 치매 치료제처럼 뇌세포 내 신호물질(cAMP) 수치를 증가시키지 않고, 단백질 키나아제를 직접 자극해 부작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프테로신 D가 이 단백질의 활성 부위에 정확히 결합한다는 사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이호성)이 암(癌) 진단과 치료, 면역 반응 유도를 동시에 수행하는 나노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진단과 치료 중 한 가지 기능만 수행하던 기존의 나노물질에 비해 치료 효율이 한층 높아 나노기술을 응용한 차세대 암 치료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나노물질: 지름 1~100 나노미터(nm, 1 nm는 10억 분의 1 m) 사이의 입자 현재 항암 치료에는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화학요법 방식이 주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이 치료법은 암 부위뿐만 아니라 정상 조직까지 손상을 가해 부작용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앞줄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KRISS 나희경 책임연구원, 이진형 박사후연구원, 이은숙 박사후연구원) 나노물질을 응용한 암 치료는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극복할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나노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면 암세포와 병변 부위를 정밀히 표적해 약물을 전달하고 제거할 수 있다. 또한 환자별 유전체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도 가능해 기존보다 부작용은 낮으면서 효과는 한층 뛰어난 치료법으로 평가받는다. KRISS 나노바이오측정그룹은 암 부위의 위치와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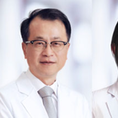
같은 병기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존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과 ‘긍정적 대처 전략(Proactive Positivity)’ 간의 상호작용이 1년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대처 전략이 낮고 우울증이 있는 환자의 사망 위험이 기준군보다 4.6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우울증 유무보다 환자의 심리적 회복력과 능동적인 대처 전략이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교신저자)·교육인재개발실 윤제연 교수(정신건강의학과 겸무, 공동 제1저자), 한국외대 투어리즘&웰니스학부 정주연 교수(공동 제1저자) 연구팀이 전국 12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조기 완화의료 임상시험에 참여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 144명을 대상으로 전향적 2차 분석을 수행한 ▲[왼쪽부터] 윤 영호 교수, 윤 제연 교수, 정 주연 교수 연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암 진단 이후 말기 상태에 이른 환자들은 자아 상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의미에 대한 혼란 등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기 쉽다. 실제로 전체 암 환자의 약 30%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

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 신용 교수 연구팀이 서울아산병원 대장항문외과 임석병·김영일 교수와 함께, 대장암을 비침습적으로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기술 ‘ZAHV-AI’를 개발했다. 이 기술은 혈액 내 세포외 소포체에서 유래한 마이크로RNA 등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대장암을 정밀하게 판별한다. 특히 0~1기 조기 병기 환자에서도 완벽한 진단 정확도(AUC 1.0)를 보여, 향후 내시경 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 (왼쪽부터) 구본한 박사, 서울아산병원 김영일 교수, 대안으로 주목된다. 임석병 교수, 신용 교수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외 소포체 분야의 세계적 권위 학술지 ‘저널 오브 엑스트라셀룰러 베시클즈(Journal of Extracellular Vesicles, IF 15.5)’에 6월 13일자로 온라인 게재됐다. 대장암은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높지만, 기존의 진단 방식은 침습적인 대장내시경이나 민감도가 낮은 종양표지자(CEA)에 의존하고 있어 조기 진단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포외 소포체를 고순도로 빠르게 분리할 수 있는 자체 기술 ‘ZAHVIS’를 개발했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신경외과 박해관 교수, 가톨릭대학교 의생명과학교실 전흥재 교수 연구팀이 세포가 잘 자라고 뼈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 고기능성 생체재료 플랫폼을 개발했다. 연구팀은 분해성 고분자인 폴리-L-젖산(PLLA)의 표면을 생체 모사 방식으로 개질해 세포 접착력과 생체친화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에 대한 논문[Investigation on biomimetic mineralization and its effect on MG-63 cell behavior on poly L-lactic acid surfaces through poly (2-methacryloyloxyethyl phosphorylcholine) conjugation : 교신저자 박해관 교수 · 전흥재 교수]을 발표하며, 향후 골조직 재생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공학 기반 치료 플랫폼에 폭넓게 응용될 수 있는 기술의 기반을 마련했다. PLLA는 생체 내 분해가 가능해 차세대 정형외과용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나, 표면의 소수성으로 인해 세포 부착성이 낮고, 신생 뼈 형성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PLLA 표면에 인산기(phosphate group)를 도입할 수 있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 연구팀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2025년에 접어들며 65세 이상 인구가 20.3%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해당 연구는 한국 의료체계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구팀은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에 대응하여 3차 의료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왼쪽부터)김평만 신부, 박병태 교수, 김철민 교수, 을 마련했다. 최창진 교수, 신현영 교수 이 법안은 의료와 요양을 지역사회 내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 개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통한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와 가정간호센터,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간 다학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7장 30항으로 구

국내 연구진이 임신 중 초미세먼지(PM2.5) 노출 시 태반의 미세구조를 손상시키고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대목동병원(병원장 김한수) 산부인과 김영주 교수 연구팀이 ‘산화 스트레스를 통한 미토콘드리아 손상을 포함한 태반 미세 구조에 대한 초미세먼지 영향(Impact of particulate matter 2.5 on placental ultrastructure including mitochondrial damage through oxidative stress)’ 연구 결과를 최근 국제 학술지 'Reproductive Toxicology에 발표했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약 900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 중 PM2.5 노출 수준에 따라 고노출군(15μg/m³ 초과)과 저노출군(15μg/m³ 이하)으로 분류해 ▲ 김 영주 교수 태반 조직을 분석했다.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정밀 분석 결과, 고노출군에서는 태반의 융모막세포 영역에서 심각한 구조적 변화가 발견됐다. 특히 ▲미세융모의 소실과 단축 ▲기저막 두께 증가 ▲공포 형성 ▲소포체 팽창 등의 손상이 확인됐다.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바로 태아 모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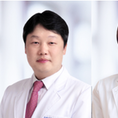
과관류증후군은 모야모야병으로 수술한 성인 환자 10명 중 3~5명이 겪는 심각한 합병증이다. 뇌혈류량이 갑작스럽게 변화해 일시적인 두통·경련·신경학적 이상소견이 발생하고, 심하면 뇌내출혈로 인해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긴다. 국내 연구진이 이 증후군의 핵심 기전을 입증하고 예측 지표를 규명함으로써, 희귀 난치질환 모야모야병의 치료 성적을 개선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조원상·김정은 교수와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 공동연구팀은 ‘뇌 자동조절 기능’을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기능의 이상이 모야모야병 수술 합병증인 과관류증후군과 연관되었음을 입증했다고 발표했다. 이 결과는 모야모야병 수술 합병증을 조기 예측할 근거를 제시해 국제학술지 (왼쪽부터)서울대병원 신경외과 조원상·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 영상의학과 유노을 교수, 고려대 뇌공학과 김동주 교수 모야모야병은 뇌로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좁아지고, 비정상적인 혈관이 자라나면서 서서히 막히는 난치질환이다. 표준 치료법은 뇌혈류를 우회시키는 뇌혈관문합술인데, 이 수술을 받은 성인 환자 10명 중 3~5명은 ‘과관류증후군’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