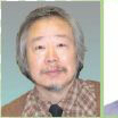
스테로이드는 1950년대부터 아토피 피부염, 건선,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피부근염, 천포창, 접촉피부염 등 의 전신 및 국소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칼시뉴린 억제제는 장기 이식 환자를 위해 개발된 면역 조절제이다. 활성화된 T 세포와 염증 세포에서 cytokine 합성과 관련된 전사인자[nuclear factor of activator T cell (NFAT)]을 억제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한다. 피부과 영역에서 처음 사용된 칼시뉴린 억제제는 cyclosporine A이다. 전신 투여하면 아토피 피부염과 건 선 치료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피부 도포는 흡수력이 낮으므로 효과가 낮다. Cyclosporine에 비해 분자량이 작으며, 피부 흡수에 용이한 topical calcineurin inhibitors (TCI)에 해당하는 tacrolimus 와 pimecrolimus가 개발되었다. TCI는 중간 강도의 스테로이드 연고와 유사하며, 장기간 사용하여도 피부 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스테로이드를 대체할수 있는 약제이다. TCI는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처음 사용되었다. 급성기

54세 여자 환자가 타병원에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상부소화관 내시경검사에서 위체상부의 대만 (great curvature)에 돌출된 점막 상부에 용종이 함께 있는 소견으로 본원에 의뢰되었다.타병원에서 시행한 용종의 조직검사에서는 과형성 용종이 진단되었으며, 환자는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것외에는 특이 과거력은 없었다. 본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 및 내시경초음파 (EUS, endoscopic ultrasound) 검사에서 점막하층에서 기원한 약 2 cm x 1.5 cm polypoid mass-like lesion with cystci core가 관찰되었다(그림 1).

신장 172 cm, 체중 74 kg의 70세 남자 환자가 2년전부터 간헐적으로 악화 완화를 반복한 우측 고관절과 동측 허벅지 바깥쪽 부위의 통증을 주소로 본원 통증센터에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통증의 강도는숫자통증등급 (numerical rating scale pain score, NRS pain score) 8/10점 이었으며, 우측 고관절부터 허벅지 바깥쪽으로 쿡쿡 쑤시는 듯한 통증이 주된 증상이었고, 가끔씩 화끈거리고 뻐근한 통증이 동반되었으나 저린 느낌과 하지 방사통은 뚜렷하지 않았다. 통증은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와 같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악화되며, 또한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심해지는 양상이었다.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통증이 없었으나, 동측 측와위로 눕게 되면 통증이 더욱 증가하였다. 통증은 밤에 더욱 악화되어 이로 인해 수면 장애가 동반되었으며, 보행 시 통증으로 인해 한번에 쉬지 않고 200미터 이상 걸을 수 없어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이 있었다. 외부 척추전문병원에서 실시한요추 MRI상, 경미한 우측 추간공 협착을 동반한 L4/5 추간판 팽만(bulging disc)이 있었고(그림 1) L2/3, 3/4,5/S1 추간판에도 퇴행성 변화 소

진행성위암은 위출구 폐색을 일으켜 오심, 구토 및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일으켜 영양실조, 악액질(cachexia), 흡인성폐렴이나 삶의 질의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 스텐트(Pyloric self-expandable metallicstent, SEMS) 삽입은 폐색으로 인한 증상을 호전시키고 경구식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는 수술적 치료에비하여 비용대비 효과가 높고,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이 가능하여, 입원기간을 단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1 반면, 합병증으로 스텐트 삽입 후 재폐색(11%), 천공(6%), 스텐트 이동(4%), 출혈(1%) 등이보고되고 있으며 드물게 스텐트 골절(1.4-2.2%)이 보고되고 있다.2-4 본 증례는 진행성 위암으로 인한 위출구 폐색으로 스텐트 삽입을 한 환자에서 스텐트 골절을 보인 증례이다. 73세 남환으로 소화불량을 주소로 개인병원 방문하여 시행한 상부위장관 내시경 검사에서 위출구 폐색을 동반한 분화도가 낮은 선암의 진행성 위암 진단 받고 본원으로 전원 되었다. 항암치료로 Titanium silicate(TS)-1 시행하였고 위출구 폐색에 대하여 스텐트(BONA Uncovered 20mm x 10cm metal st

신장 168 cm, 체중 70 kg의 58세 남자 환자가 1년전부터 시작된 우측의 팔꿈치 통증을 주소로 본원 통증센터에 내원하였다. 환자는 직업과 관련하여 평소 손으로 가위질을 많이 하는 편이라고 하였다. 특히, 팔을 펴는 동작에서 심한 통증이 있었고 내원 당시 통증의 강도는 숫자통증등급(numerical rating scale pain score, NRS pain score) 6-7/10점이었다. 이학적 검사상, 우측의 외측상과 부위와 팔꿈치 폄근의 압통이 관찰되었다. 특히, 손목을 신전한 상태에서 저항을 가하면 동일 부위의 통증이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팔꿈치 이하의 감각은 정상이며 운동능력 역시 정상 범위였다. 외래에서 시행한 초음파 검사상, 좌측과 비교하니 우측의 외측상과 부위의 석회화 및 주변 인대의 경미한 부종이 관찰되었다. 단순 방사선 사진에서도 좌측과 비교시, 우측의외측상과 부위의 경도의 석회화 침착을 관찰할 수 있었고 이는 내측상과 부위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그림 1). 환자의 이학적 검사와 영상 검사를 종합할 때, 외측상과염으로 진단하였다. 초음파 유도하에 외측 상과 부위에 부착하는 상완의 신전근 인대를 포함한 주변 조직에 스테로이드와
간’은 침묵의 장기로 유명하다. 간 내부에는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종양이 커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다. 또한 간의 70~80% 정도가 손상되더라도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간기능이 유지되기 때문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간의 대표적인 질환은 바로 ‘간암’이다. 증상이 없어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소리없이 확산되어 매우 위험하다. 간암의 발병 원인은 다양하지만, 주범은 바로 ‘만성 바이러스 간염’이다. 간염 바이러스는 대표적으로 ‘A, B, C형’이 있다. 그 중 만성간염을 일으키는 것은 B형과 C형이다. A형은 대개 급성간염으로 지나가지만 드물게 급성간부전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ABC 간염의 원인과 예방,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 경희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심재준 교수에게 들어봤다. A형 간염은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에 비하여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B형 및 C형 간염은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지만, A형 간염은 대개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이를 대변하듯, 최근 들어 A형 간염환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오염된 식수, 어패류, 상한 우유 등의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부분 위

성인 ADHD(주의력결핍과다활동증후군)는 집중의 어려움과 과다행동, 그리고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아청소년 ADHD와는 다르게 집중의 어려움과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비교적 흔한 신경발달질환이다. 과다행동은 나이가 들면 서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성인이 된 후 증상의 양상은 변하지만, 주의력 결핍이나 충동성 등의 문제가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아 시기에 ADHD가 있는 경우 60% 정도가 성인까지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여 성인 ADHD 유병률은 국내에서는 정확히 조사되지 않았지만 2.5%∼4.4%의 유병률을 갖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낮은 교육수준과 직업의 부재,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감정조절, 이상행동 등의 문제와 함께 이혼과 교도소 수용 등의 위험성이 높아 진다. 성인 ADHD 환자의 70∼80% 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물질사용장애, 섭식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포함하는 성격장애 등의 공존질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인 ADHD 환자는 공존질환을 위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다. 원인 성인 ADHD의 원인은 단일 병리가 아니며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고

내약성 칼시포트리올(DaivonexⓇ, LEO Pharma AS, Denmark) 약제는 일반적으로 건선 환자에게 부작용없이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병변부 또는 병변 주위의 자극감이다. 연고에 비하여 크림 제형은 얼굴이나 접힘부와 같이 민감한 부위에 사용한다. 고칼슘혈증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최대 용량은 하루에 15g, 일주일에 100g이다. 1. 단기 연구 칼시포트리올 크림은 단기(6~8주) 연구에서 큰 부작용이 없었다. 6주동안 칼시포트리올 크림을 도포한 대규모 관찰 연구(1733명)에서 1.5%의 환자만이 약제와 관련된 부작용을 경험하였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발진(0.8%의 환자), 가려움증(0.5%), 화끈거림(0.5%)이 있었다. 환자와 의사가 판단한 내약성은 90% 이상의 환자에서 좋거나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표1). 413명의 건선 환자가 무작위로 칼시포트리올 크림 또는 위약을 8주동안 사용한 연구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병변부 또는 얼굴, 두피의 자극감이었다. 그러나 부작용의 빈도는 치료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4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6주간의 임상 시험에서 칼시포트리올 크림 또는 연고를 사용한 대상자에서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6월 8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 국제회의실에서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예방 및 치료 연구 능력을 강화하고자 ‘제3회 아보바이러스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매개체 전파 감염병은 모기나 진드기와 같은 매개체에 의해 전파되는 아보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질환으로 최근 기후변화, 해외여행 등에 의해 전 세계적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로 3번째 개최하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매개체 전파 감염병 연구자들 약 5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지카, 뎅기, SFTS 등 아보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연구 성과 및 현황 등을 논의한다. 특히, 지카 및 SFTS에 대해 우수한 연구 경험을 보유한 정재웅 교수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를 초청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교류할 예정이다. 감염병연구센터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카 및 SFTS 바이러스에 대한 상용화된 치료제 및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외 관련 연구자들이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외 연구자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센터는 국내 매개체전파 감염병에 대한

한 여인이 수술방 침대 위에 누워 있다. 대장암 3기로 진단된 이 환자는 대장절제술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방 한구석에는 거미 다리의 모양을 한 여러 개의 팔을 가진하얀색 기계가 서 있고, 환자는 이 로봇을 통하여 수술을 받게 될 것이다. 마취가 시작되고 기계가 환자 쪽으로 다가온다. 담당의사가 수술시작 버튼을 누르고 수술이 시작된다. 로봇 팔 하나하나가 환자의 몸속으로 들어가 수술 전 입력된 환자의 여러 가지정보에 따라 정밀한 움직임을 통해 전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림프절을 제거하고 혈관을 찾아 결찰한다. 그 움직임은 흡사 사람의 손의 움직임과 다르지 않을뿐더러 미동조차 없이 움직인다. 수술 전 촬영한 컴퓨터 단층 촬영과 자기공명영상 등을 바탕으로 하여 암 조직이 남아있을 가능성에 대한 검증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다. 최종 단계로 암이 있는 대장 부위를 잘라낸 후 조심스럽게 연결한다. 제거한 조직들은 비닐봉지에 담겨 몸 밖으로 나오고 로봇 팔이 들어갔던 상처는 수술용 글루를 사용해 봉합된다. 로봇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나 의료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라면 이러한 상상을 할수도 있겠다. 필자는 실제로 로봇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고 앞으로

2015년 국내 국가암등록 자료에 의하면 대장암은 발생률 면에서 남성에서는 2위, 여성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림 1), 대장암 사망률은 남성에서는 4위, 여성에서는 2위를 차지하고 있다. 2016년도 통계청 자료에서는 대장암 사망률이 위암을 처음으로 추월하여 화제가 되었다. 2012년 보고된 Globocan 보고서에서도 이미 국내대장암 발생률은 비교 대상인 20개 국가들 중 일위였으며, 캐나다, 싱가폴, 일본보다도 더 높았다. 따라서, 국내에서 대장암 검진은 매우 중요한 보건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에서는 대장암에 대해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건강보험공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장암 국가암검진 프로그램은 50세 이상 성인에게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제공하고, 분변잠혈반응 검사가 양성일 경우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분변잠혈검사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분변잠혈검사를 매년 받으면 검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32% 감소하며, 2년에 한번만 검진에 참여하더라도 대장암에 의한 사망률이 22% 더 감소한

서론 우리나라 암 발생률은 2011년 이후 감소를 보이지만 국내 대장암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7년 발표된 중앙암 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우리나라 남, 여전체에서 약 20만 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대장암은 남녀를 합쳐 전체의 12.5%로 2위를 차지했다. 대장암의 완치를 위한 유일한 치료는 근치적 절제이나, 전체 환자의 50%는 진행성 혹은 재발성 대장암 환자가 차지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두 고식적 항암화학요법의 대상이 된다. 절제 불가능한 전이성 대장암의 치료에는 1970년대 개발된 5-FU 이후로irinotecan, oxaliplatin, capecitabine, TAS-102 등의 5개 항암제와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나 혈관 내피 성장인자(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혈관 내피 성장인자 수용체(VEGF-R) 를 표적으로 하는 표적 항암제로 cetuximab, panitumumab,bevacizumab, aflibercept, regorafenib 등의 5개 표적항암제가 미국 FDA에 인정받아 사용되고 있다.